[생활 속 디자인] 침대와 의자에 대하여: 사람을 담는, 가장 인간적인 가구
- artviewzine
- 2024년 8월 6일
- 6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4년 8월 7일
집 안의 가구는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사물’을 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담는 것이다. 사물을 담는 가구는 수납장과 책장등이다. 수납장은 주방 가구, 책장, 장식장, 크고 작은 서랍들로 그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 현대인은 워낙 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있고 그 물건들은 대부분 사람에 의해 사용되기를 기다린다. 그 대기의 시간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수납 가구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을 담는 가구는 무엇일까. 바로 침대와 의자다. 사람은 집 안에서라면 방바닥에 그냥 눕거나 앉을 수도 있다. 원시 인류는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은 누울 자리와 앉을 자리는 뭔가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한 듯하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다. 청결과 위생, 편안함 그리고 지위의 상징 같은 것들이다. 이번 호에서는 사람을 담는 대표적인 가구, 사람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가구인 침대와 의자를 자세히 살펴보자.
침대, 안전과 편안함을 위한 발명품
인류의 사촌인 침팬지는 침대를 만드는 영장류(靈長類)로 알려져 있다. 침팬지는 나뭇가지로 구조를 만들고 그 위에 나뭇잎을 덮어 그들만의 침대를 완성해 그곳에서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낸다고 한다. 침팬지가 커다란 나뭇가지 위에 침대를 만드는 이유는 벌레와 세균, 독이 있는 작은 동물로부터 몸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사람이 만든 초창기 침대의 목적도 침팬지 침대와 다르지 않았다. 바닥을 기어 다니는 해충이나 작은 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침대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중세까지만 해도 서양 서민들의 집은 지저분했다. 바닥은 마감이 되지 않은 흙이어서 그곳에 각종 벌레가 돌아다니고 오물로 뒤범벅이 되었으며 쥐까지 살았다. 그런 곳에서 사람들은 짚이나 천을 바닥에 깔고 잠을 잤다. 건초가 주요 잠자리여서 건초를 두드려 뭉치는 행위를 뜻하는 ‘hit the hay’는 ‘잠자리에 들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건초 뭉치 자체가 잠자리였고, 이것을 천 자루에 집어넣으면 매트리스가 되었다. 중세까지 서민들에게 침대란 매트리스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요와 다르지 않았다. 중세까지만 해도 침대(bed)는 오늘날의 매트리스를 뜻했다. 매트리스를 올려 놓을 수 있는 나무틀은 ‘침대틀(bedstead)’이라고 불렀고 이것은 상류 사회의 전유물이었다.
그렇다면 침대틀은 언제 탄생했을까. ‘문명의 요람(Cradle of Civilization)’이라는 개념이 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같은 인류의 초기 문명이 시작된 지역을 의미한다. 아기를 요람에 재우는 문명은 이미 침대가 발전한 곳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명이란 잠을 잘 잘 수 있는 공간과 가구를 만들어 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고대 문명에서는 침대를 이용했다. 대부분의 평민은 땅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잤지만, 왕족과 귀족들은 기원전 3000년경부터 매트리스를 공중에 띄우는 침대를 사용했다.
매트리스를 공중에 띄우는 것은 기능적인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기능적으로는 먼저 바닥으로부터 몸을 분리해 바닥에 있는 여러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바닥에는 건강을 위협하는 작은 생명체들이 살기 때문이다. 그다음은 딱딱하고 차가운 바닥으로부터 벗어나 몸을 편안하게 눕히는 것이다. 고대 이집트 파라오 투탕카멘(Pharaoh Tutankhamen)의 침대는 나무로 만든 네 각의 틀 안으로 식물의 줄기를 촘촘하게 엮어서 받침대를 만들었다. 바닥과 침대 상판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 그곳으로 공기가 통하면서 침대에 누운 몸을 좀 더 쾌적하게 만들어 줬다.

15세기 프랑스 대저택의 방을 묘사한 삽화에 거대한 캐노피 침대가 있다
귀족들의 방 속 방, 캐노피 침대의 비밀
중세는 물론 19세기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했으므로 침대는 집 안에서 가장 값나가는 물건이었다. 특히 상류 사회에서는 네 귀퉁이에 기둥을 세우고 천으로 덮개를 한 캐노피 침대(canopy bed)가 필수품이었다. 성에 거주하는 왕가의 가족들은 모두 커다란 방에 캐노피 침대를 설치하고 살았다. 중세의 성은 차가운 돌로 만들어져 겨울이 되면 매우 추웠다. 커다랗고 추운 방에서 혼자 자는 것은 에너지 손실이 컸기 때문에, 옆자리에 36도짜리 인간 난로가 있으면 유용했다. 벽난로는 차가운 공기를 데우는 데 한계가 있었고 기술적으로 낙후되어 연기나 그을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워 잠자는 동안 무용지물이었다.
이렇게 왕자와 공주의 방에서는 하인들이 숙식을 함께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최고 높은 계급인 로열패밀리들에게 비밀스러워야 할 사생활은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그나마 캐노피 침대의 커튼이 왕자와 공주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었다. 이뿐만 아니라 방의 차가운 공기나 바람을 막아 주는 기능도 했다. 밤이 되면 왕자와 공주 그리고 최측근 하인을 제외한 사람들은 바닥에 여기저기 누워 새우잠을 청했다. 귀족의 집 또한 주인 부부가 침대에서 잠을 자면 하인들도 주변에서 잠을 자다가심부름하곤 했다. 심지어 부부가 사랑을 나누는 중에도 하인이 같은 공간에 있었다. 그러니 침대의 캐노피와 커튼은 꼭 필요했다.
캐노피 침대는 말하자면 커다란 방 속의 또 다른 방인 셈이다. 귀족의 캐노피 침대가 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크기 때문이다. 1580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웨어의 거대한 침대(Great Bed of Ware)’라는 이름의 캐노피 침대는 가로 3.26미터, 세로 3.38미터의 크기다. 이 정도면 3.5평 정도로 한옥의 한 칸짜리 방보다 훨씬 크다. 침대야말로 귀족의 은밀한 방이었으므로 그것은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고대 이집트 왕인 투탕카멘 (BC 1341~1323)의 침대 © ddenisen
19세기 산업 혁명으로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유럽에서는 비밀스러운 개인의 방이 증가했다. 새로운 중산층은 큰 방에서 하인들과 함께 자지 않고 하인들의 방을 따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캐노피 침대의 커튼이 불필요해졌다. 더 간결한 침대를 추구했으며 나무가 아닌 금속으로 틀을 만든 침대도 등장했다. 근대의 침대는 장식보다 안락함을 추구하며 매트리스의 진보가 이루어졌다. 초기 근대의 매트리스는 짚더미나 새의 털을 사용했으나 나중에는 면과 양모로 대체되었다.
1871년에는 독일인 하인리히 베스트팔(Heinrich Bestpal)이 최초로 천연 재료가 아닌 인공적 스프링을 넣은 매트리스를 발명했다. 이후 1931년에는 합성수지, 즉 플라스틱의 일종인 라텍스를 넣은 매트리스가 생산되었다. 오늘날 침대 제조사들은 숙면 과학을 바탕으로 인체공학적인 침대를 제작하는 데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의 침대가 하인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화려하게 장식되었다면 현대의 침대는 건강한 숙면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인생의 3분의 1을 침대에서 보내는 만큼, 침대는 정말 중요한 가구가 아닐 수 없다.
의자의 탄생, 지위를 나타내는 가구
잠시 생각해 보자. 오늘날 의자만큼 사람의 몸과 밀착된 사물이 있을까. 일을 하거나 대중 매체를 관람하거나 쉴 때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도 현대인의 몸은 의자와 붙어 있다. 이토록 흔한 의자가 모든 이들의 민주적인 가구가 된 건 생각보다 역사가 길지 않다. 일단 의자는 편안하게 앉는 것을 목적으로 태어나지 않았고 침대와는 조금 다른 목적으로 탄생했다.
의자의 역사는 신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약 1~4만 년 전에 만들어진 토우(土偶)가 동유럽에서 발견되었는데, 그중에는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을 묘사한 것도 있었다.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은 여성으로, 학자들은 신석기 시대가 남녀평등 사회이자 모계 사회였다고 추측한다. 의자에 앉은 사람은 그 부족의 우두머리 여성으로 여겨진다. 신석기 시대의 의자는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생활용품이 아니라 지위를 나타내는 도구였다. 기원전 7500년에 존재했던 차탈회위크(Çatalhöyük)의 여신상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부족의 우두머리를 왜 의자에 앉힌 걸까. 의자에 앉는다는 건 땅바닥에 앉는 것과 다른 의미를 지닌다. 의자는 일종의 경계를 만드는 일이다. 의자에 앉은 사람을 바닥에 앉거나 서 있는 사람과 구별하여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주려는 것이다. 또 의자에 앉는 행위는 다리를 쓰지 않는 점에서 지위가 더 높다는 것을 증명한다. 어느 시대에나 지위가 높은 사람은 몸을 이용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편안하게 앉아서 말로 지시를 하는 사람이다. 그는 육체가 아니라 머리를 쓰는 사람이다. 이렇듯 의자는 지위를 표현하는 도구였으므로 생활용품으로 광범위하게 퍼지지 않았다.

1945년 가구 디자이너 찰스와 레이 임스 부부가 디자인한 의자(좌) / 18세기 로코코 양식의 베르제르(우) © shutterstock
산업혁명 후 확산한 의자의 대중화
서양에서는 일찍이 입식 문화가 자리를 잡아 의자는 상류 사회는 물론 서민들의 생활에서도 나타났다. 하지만 가난한 서민의 의자는 상류 사회의 그것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대부분 등받이가 없는 스툴(stool)을 사용했다. 식탁에서는 옆으로 긴 스툴에 여러 사람이 함께 앉아 밥을 먹었다.
네덜란드 풍속화가 피터르 브뤼헐(Pieter Bruegel)이 그린 <농가의 결혼식>을 보면 모든 하객이 스툴에 앉아 식사하는데 딱 한사람만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있다. 이 사람은 신부의 아버지다. 물자가 부족한 서민들은 의자 대신 술을 만드는 데 쓰는 오크통을 임시변통해 쓰기도 했다. 반면에 귀족들은 등받이와 팔걸이, 쿠션이 있고 화려하게 장식한 천으로 덮은 아주 사치스러운 의자에 앉았다. 대표적인 의자가 바로 프랑스 궁정에서 유래한 포테유(fauteuil)와 베르제르(bergère)다. 포테유는 프레임 구조이고 베르제르는 면이라는 차이가 있다.

1568년 네덜란드 풍속화가 피터르 브뤼헐이 그린 <농가의 결혼식>
19세기 제국주의와 산업 혁명으로 부유해진 서유럽에서는 중산층이 증가했고, 그들의 여가를 돕기 위한 대량 생산 의자가 처음으로 탄생한다. 오스트리아의 가구 장인이자 사업가인 미하엘 토네트(Michael Thonet)가 개발한 토네트 의자가 그것이다. 기다란 나무 봉을 휘는 곡목(曲木) 기술을 발전시켜 아주 저렴한 토네트 의자를 생산할 수 있었다. 나무를 휘어서 의자를 만들면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는 공정이 사라지므로 쉽고 빠른 제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19세기 중반에 개발된 토네트 의자는 지금까지 수억 개가 팔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자 중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그야말로 모든 이들의 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의자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와 기술이 개발되었다. 헝가리 출신 가구 디자이너인 바우하우스의 마르셀 브로이어(Marcel Breuer)는 강철관을 처음으로 가구에 적용한 B3(THE WASSILY CHAIR)를 내놓아 혁신을 일으켰다. 20세기 중반 미국의 가구 디자이너 찰스 임스(Charles Eames)와 레이 임스(Ray Eames) 부부는 합판을 기계로 프레스하는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해 의자의 대중화를 더욱 촉진시켰다. 좌석과 등받이는 합판으로, 다리와 프레임은 강철관으로 만든 의자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부터 학교 의자로 채택되었다.
18세기 신고전주의 양식의 포테유(좌) / 1859년 디자이너 미하엘 토네트가 디자인한 토네트 체어(우)
하지만 1960년대에 개발한 사출 성형(射出成形, injection molding) 의자만큼 의자의 대중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의자는 없다. 1967년 스위스 가구 회사 비트라는 덴마크 디자이너 베르너 판톤(Verner Panton)이 디자인한 아주 독특한 형태의 의자를 플라스틱 사출 성형 기술로 생산하기에 이른다. 플라스틱의 고체 원료를 액체로 녹인 뒤 그것을 의자의 형태로 비어 있는 금형 안으로 쏘아 준다. 금형 안의 빈 공간이 액체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고 몇 분이 지나면 다시 딱딱한 고체가 되어 하나의 의자가 완성되는 것이다. 의자 하나를 생산하는 데 불과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으므로 생산 효율성이 상당히 높다. 의자가 하나의 몸체이므로 이것을 ‘모노블록(Monoblock)’이라고 칭한다.
오늘날 대표적인 모노블록은 서양에서는 ‘가든 의자’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플라스틱 의자인 ‘마트 의자’라고 부른다. 모노블록 의자는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다. 편의점, 카페, 술집, 야외 공연장 등 눈에 밟힐 정도로 많다.
어쩌면 의자는 침대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몸과 접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고 보면 인류는 침대에 누워 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하루 중 대부분이다. 그러니 이 두 가구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가구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1925년 가구 디자이너 마르셀 브로이어가 디자인한 B3 체어(좌) / 판톤 체어, 디자인: 베르너 판톤, 1967년 LCM(Lounge Chair Metal)(우)
글 김신 디자인 저널리스트
홍익대학교 예술학과에서 미술이론을 전공했다. 월간 <미술공예> 기자를 거쳐 월간 <디자인> 기자와 편집장으로 일했다. 2011~13년에 대림미술관 부관장으로 있었다. 2014년부터 칼럼니스트로 독립해 디자인 관련 글을 기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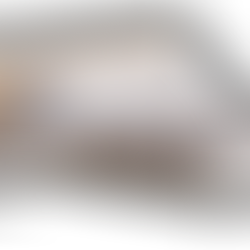















コメント